조금이라도 자료를 찾아보고 이사를 준비했다면 좀 더 똘똘한 결정을 내렸을지도 모른다. 계절의 변화를 생각했다면 바닥 장식품을 아예 안 샀을 것이고, 그 전에 이미 덜 단조로운 장판을 깔아놨을 것이다. 그러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껴 카페트를 들이기로 했다면 금세 질리는 호피가 아니라 강렬한 원색 두어 개를 골라 기분에 따라 바꿔 쓰는 것으로 충분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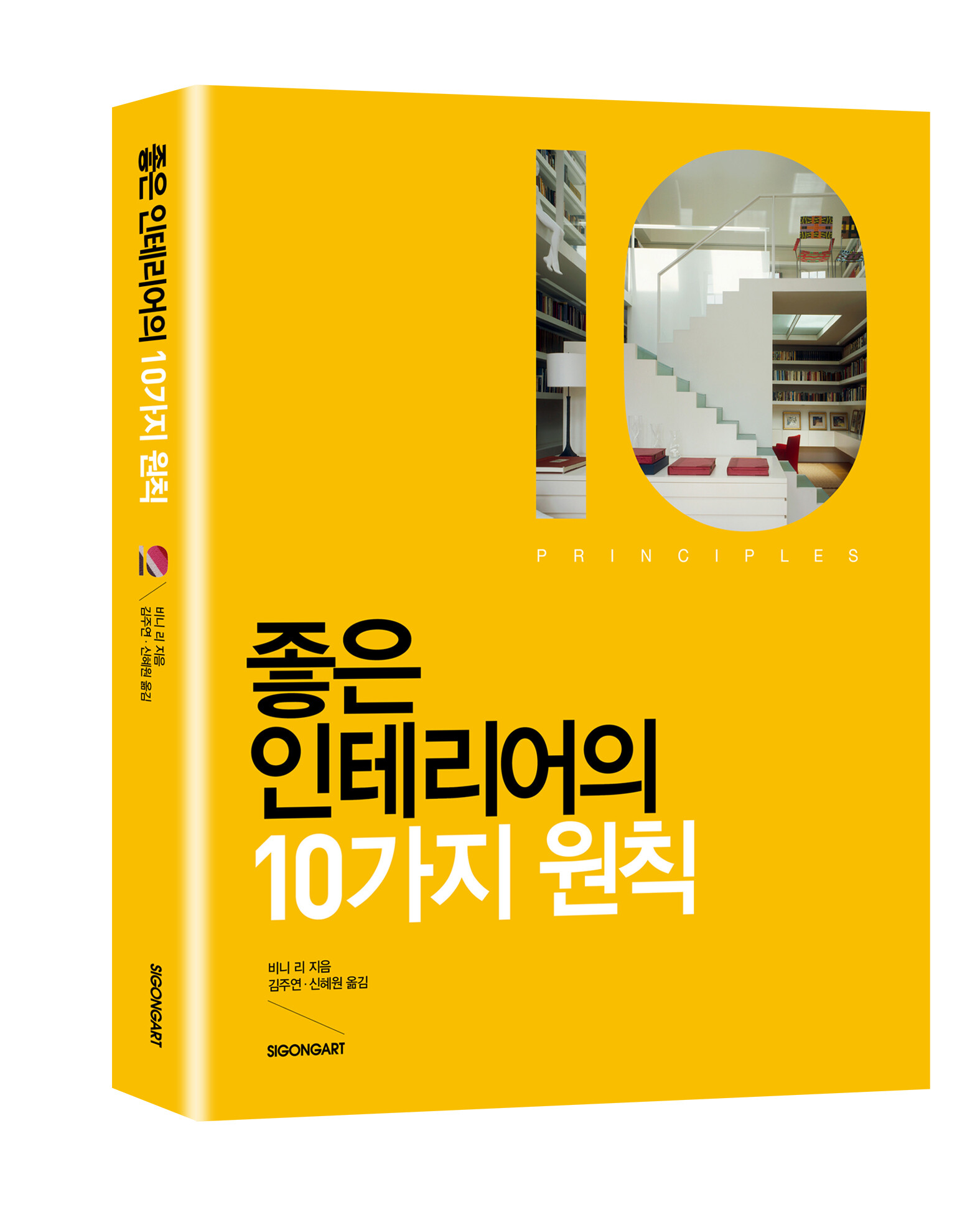
비니 리의 <좋은 인테리어의 10가지 원칙>은 이처럼 실패해 본 사람들을 위한 안내서다. 그리고 실패를 줄일 수 있도록 책을 참고하거나 넘치는 인터넷 자료를 검색하라 권한다. 가구점에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저자는 미국인이다. 사례로 등장하는 집은 미국을 비롯해 뉴질랜드와 영국 등이기에 주거문화가 우리와 많이 다르지만, 그러나 동떨어진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새집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고민은 크게 다르지 않다. 가구와 소품을 들이고 조명을 선택하고 예산 계획을 짜야 한다. 책은 이상적인 결정에 대한 몇 가지 사례들을 소개한다. 소파와 쿠션이 어떤 색감대비를 이뤄야 탁 트인 효과를 주는지를 이야기한다. 가구를 약간 삐딱하게 배치한다면 정돈된 효과 이상의 이득을 누릴 수 있다. 공간의 확보다. 가구도 숨을 쉰다는 느낌까지 준다.

중요한 건 색상이다
집 전체에 논리적인 흐름을 만들 것, 자연광 활용을 높일 것 등 책이 제안하는 열 가지 원칙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는 분야는 색상이다. 집을 망칠까 두려워 대다수가 과감한 색을 꺼린다. 안전한 결과를 위해 단순한 패턴을 사용하기 마련이지만, 책은 우리가 무미건조한 공간에서 살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한다.
색상에 대한 과감하고 명쾌한 결정은 집을 추억하게 만드는 힘까지 갖는다. 따라서 언제든 우리는 한쪽 벽면을 밝은 색으로 칠할 수 있고, 쿠션과 카페트를 생기있는 색상으로 바꾸면서 가볍게 시작할 수도 있다. 그건 즐거운 일이지 두려워 할 일이 아니다.

[저작권자ⓒ 우드플래닛.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