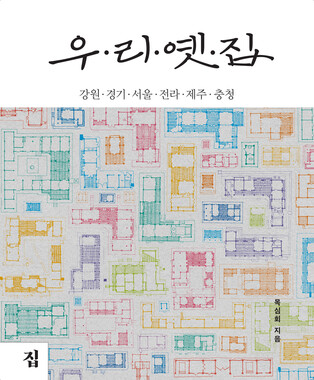네덜란드 출신의 플로렌타인 호프만(Florentijn Hofman)은 ‘러버덕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대지 미술가가 되었다. 전 세계에 즐거움을 퍼뜨리기 위해 곳곳을 누비는 러버덕은 2007년 프랑스의 생나제르를 시작으로 남미와 유럽, 아시아 대륙을 거쳐 지난가을 한국의 석촌 호수에도 한 달간 머물렀다. 호프만은 러버덕뿐만 아니라 하마와 토끼, 원숭이 등 다양한 동물의 형체를 대지 위에 선보였는데 그중 나무를 재료로 한 그의 프로젝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거대 조형물의 서프라이즈

1960년대 영국과 독일에서 성행했던 설치 미술의 한 흐름인 대지 미술(Land Art)은 대자연을 거대한 도화지 삼아 작품을 선보이는 형태의 장르다. 미술관을 벗어나 사막이나 산악, 해변, 강가, 초원, 설원 등의 자연 공간을 파헤치고 선을 새겨 표현하거나 거대한 규모의 설치물이나 인공물을 대지에 전시하는 것이다. 플로렌타인 호프만은 주로 각 도시의 상징이 되는 장소나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공공장소에 그의 작품을 선보인다. 매일 지나던 길에 어느 날 갑자기 10m가 훨씬 넘는 대형 토끼 혹은 원숭이가 드러누워 있다면 어떨까.
“많은 사람이 일상에서 지나치는 공공장소에서 새로운 영감을 받기를 바라죠. 일상적인 공간은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고 잊히기 쉽죠. 그런 곳에 예상하지 못한 거대 설치물이 놓이면 그 순간 새로운 광경이 되고 새로운 감동을 얻게 되죠. 일상이 특별해지는 것을 말해요.”
호프만의 대지 미술은 일상의 서프라이즈다. 서프라이즈라함은 아무도 모르게 준비해 디데이에 ‘짠’하고 나타나야 맞지만, 대지 미술은 규모가 큰 만큼 ‘아무도 모르게’ 작품을 옮기고 설치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호프만과 그의 스태프들은 최대한 비밀리에 프로젝트를 준비한다.

“사실 러버덕을 제외하고는 설치과정을 드러내 놓아도 그다지 눈치를 채는 이들이 많지 않아요. 그냥 어떤 공사를 하는 줄 알죠. 혹여 우리의 설치 과정을 알아채고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해 그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 찍은 것은 저희 설치물의 일부만을 포착한 거죠. 사실 전체의 모습은 그보다 더 거대해지니 괜찮아요.”
지역 커뮤니티 속으로 들어가다
호프만이 세계 곳곳에 선보였던 설치물을 몇 가지 소개해보자면, 중국 타오위안의 달토끼(Moonrabbit), 영국 런던 템즈 강의 하마(Hippopothames), 러시아 상트 페테르브루크의 일광욕하는 토끼(Sunbathing Hare), 브라질 상파울로의 뚱뚱한 원숭이(Fat Monkey) 등 세계 각국의 상징적인 공간에 대형 동물 조형물을 설치했다. 그저 귀여운 동물들을 주제로 각국의 명소에 설치물을 두는 것 같지만 모든 장소와 대상, 재료는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있다.

호프만이 작품을 기획하고 전시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점이 바로 현지 사람들과 공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혀 생뚱맞은 거대 조형물이 나타나면 황당하기만 할 뿐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그 지역의 역사 혹은 풍습, 또는 익숙한 재료를 활용에 거대 조형물을 친근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고민한다.
“다른 이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혹은 작품으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관객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친숙한 재료나 이야기로 다가가야 하죠. 그래서 브라질의 원숭이는 그 지역 누구나 신고 다니는 플립플롭(flip-flop)으로 제작했고, 스웨덴의 옐로 레빗은 그 지역의 지붕 널판을 활용했죠. 재료뿐만 아니라, 상트 페테브루크의 일광욕하는 토끼는 러시아사람들에게 마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는 공감을 불러일으켰죠. 이처럼 대지 미술은 지역적 커뮤니티 속으로 들어가 메시지를 전달해야 해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거나 공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실패하는 거죠.”
관객의 힘으로 퍼지다

대지 미술은 대부분 공공장소에 대형 조형물이 설치되는 특성상 한 장소에서 전시를 오래 유지하기 어렵다. 그래서 관객이 직접 찍은 사진이나 영상 자료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대지 미술 작품이 전시가 된 장소를 기점으로 적정 거리 이상으로 널리 퍼지는 것에 한계가 있다. 그런데 호프만의 러버덕 프로젝트뿐 아니라 요즘의 대지 미술이 세계적인 프로젝트로 거듭나는 방법이 생겼다. 바로 전 세계에 퍼져있는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유저가 서포터가 되어주는 것이다. 호프만의 노란 고무 오리가 전 세계의 평화 캐릭터가 된 것도 SNS의 도움을 톡톡히 받은 것도 사실이다.
“나와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미술가들에게는 관객이 가장 중요한 요소에요. 관객이 우리의 작품을 보고 퍼뜨려줘야 모든 게 의미를 가지게 되죠. 만약 아무도 제 작품을 촬영하지 않고 온라인에 퍼뜨리지 않는다면 아마 내가 스스로 그 작업을 하고 있을 거예요.”

모든 미술 작품이 그렇겠지만, 작품을 알아봐 주는 관객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더군다나 일시적으로 전시되고 사라지는 대지 미술의 경우 관객의 존재가 더욱 중요하다.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대지 미술이지만 호프만의 러버덕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인식되었다. 미술관에서 화이트 월에 걸린 작품을 감상하는 법에서 벗어나 우리의 일상에서 펼쳐지는 동화 같은 대지 미술을 만나게 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사진으로 담길 바란다.
[저작권자ⓒ 우드플래닛.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