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생의 연(緣) 만으로 흔들리는 저 시선의 깊이.
예술은 한 경계를 열고, 한 세계를 품고, 화(和)를 이룬다.
예술은 그린벨트가 아니라 이 사회의 토양에 자라난 잡초

나점수의 조각은 곧 시(詩)다. 식물적 사유에서 길어온 정제된 언어다. 길이 길에서 만나 다시 길을 만드는 생각의 이음이다. 그의 작품 앞에 서면 생각의 길이 열린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인사동 ‘갤러리3’에서 만난 작가는 우주의 한 공간을 빌어 생각의 중심을 이곳으로 옮겨온 듯 보였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나무의 수축과 팽창만큼 거대한 율동을 따르는 이 사물들을 보편적 진리라 볼 수 없다. 식물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관계 맺지 않는다. 간극이 있을 뿐, 간극이 주는 아득한 넓이 속으로 사유라는 것이 부유할 뿐, 그래서 나점수의 작품은 곧 화두다.

나무를 매개로 ‘여행’하고 ‘순례’하며 ‘시대’를 만난다. 마치 카르마에 들고자 수속 밟는 지구인처럼. 우리는 이곳에서 나무가 전 우주를 상대로 벌이는 투쟁을 만날 수 있다. 중앙대학교 조소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조각가 나점수는 지난 10여 회의 개인전을 통해 만물의 근원과 관계를 정립하는 구도의 예술가로 널리 알려졌다.
이번 전시회는 나무라는 물성을 매개로 중의어로서 식물(植物)의 의미와 어떤 식의 상태로서 식물(式物)이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행위와 흔적의 진폭을 지지하게 하는 어떤 세계를 응시하는 일이 곧 나점수 작업의 시작이다. 작가는 말한다. “한 세계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직 때가 아닌 것이다.” 시중(時中)이라는 말과 은자(隱者)라는 말을 떠올리며 작가는 나무와 마주한 때를 주체적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 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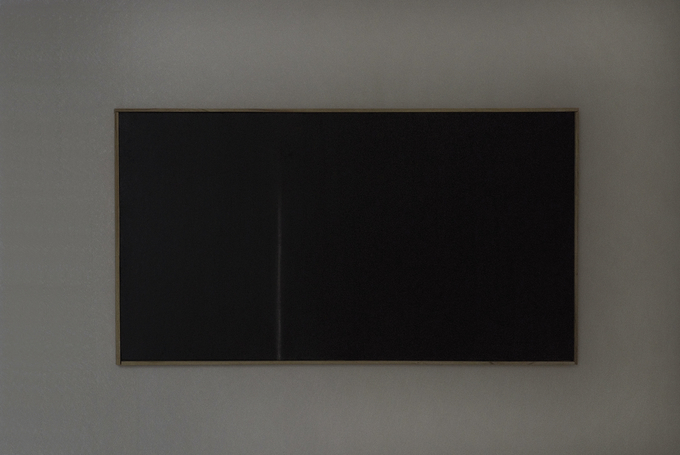
나점수는 한때, 순례자로서의 시간을 그리워하던 때가 있었다. 순례는 떠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놓여지기 위한 과정이라 여겼다. 씨방의 씨앗이 허공을 향할 때 그들은 떠남이 목적이 아닌 어떤 장소에 붙들리는 것이 목적일 것이다. 작가에게 어떤 장소란 정신이다. ‘남는 것은 정신뿐이다’라는 말처럼 작가의 세계는 정신이어야 한다.
형태란 세상 모든 것에 있고, 의미는 근저의 시선으로부터 발아(發芽)한다. 저 사소하게 보이는 들풀과 작은 소리들...그것이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은 내 육신이 한때 숲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생의 연(緣)만으로 흔들리는 저 시선의 깊이를 가늠하기에는 작가의 의식과 손은 나약하다.
● 시선


얼마 전 그는 사소하다고 여길 수 있는 나뭇잎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어떤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다. 비록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의식 어딘가에 각인되는 듯했다. 붙잡고 있던 어떤 것으로 부터의 탈각되는 자유와 뿌리로 향하는 자기분해의 과정에 동참하는 ‘잎’이 주는 가볍지 않은 충격… ‘잎은 뿌리로 간다’라는 말을 생각하며 시선은 작업을 향했다.
● 풀


한 세계를 대면하기 위해 씨방을 살찌우는 풀들을 바라보게 된다. 때가 일러서인가 그들은 아직 세계를 향해 닫힌 문을 열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날 그들에게는 망설임이라는 의미가 인간의 언어임을 증명하듯이 허공을 향해 열리고 만다. 그것이 그들이 붙잡고 있던 빈 씨방을 남긴 의미일지 몰라도, 바람 지난 자리에 풀들이 있고 작은 것들이 흔들린다.
● 숲


흔들리는 나무를 부둥켜안고서 자신 또한 흔들린다는 것을 알았다. 땅으로부터 기둥을 세우고 시원(始原)의 시간을 흔드는 숲의 소리가 시작된 지점을 알지 못한다. 그곳에서 함께 흔들릴 뿐.
● 시대

작가는 몇 가지 의사에 동의한다. 순례자의 남루함을 빈곤으로 여기는 사회는 진정 빈곤하다. 예술가의 감각을 소유하는 사회는 진정 빈곤하다. 감각이 넘쳐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회는 무감각하다. 숲이 없는 도시에 정신이 있을 리 없고 광야가 없는 마음에 정신이 있을 리 없다.
상처를 밟고 서는 사회에 인간의 정신이 설 자리는 좁다. 예술은 그린벨트가 아니라 이 사회의 토양에 자라난 잡초여야 한다. 예술은 한 경계를 열고, 한 세계를 품는다. 품어 안고서 화(和)를 이룬다.
[저작권자ⓒ 우드플래닛.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